[옴부즈맨 김우일 박사 칼럼] 우리사회의 정치꾼과 정치가
2024년 06월 05일 [옴부즈맨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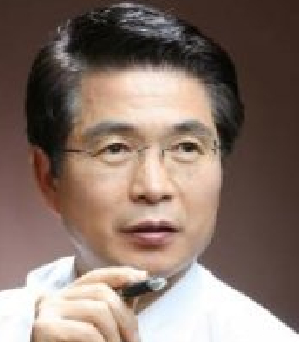
↑↑ 본지 논설위원 겸 대우M&A 대표 김우일 박사
ⓒ 옴부즈맨뉴스
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여소야대의 틀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판을 개장했다.
투표율 67%로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여 새로운 정치 갈망을 표현했다. 정치에 투표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 새삼 생각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 아니면 못한 사람인지,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과 같이 구분이 어렵다는 사실이다.
듣도 보도 못한, 아닌 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의 정체, 특히 감춰진 내면의 인성, 이념, 철학을 알 수가 없다.
겉으로 번지르르한 가면을 덮어쓴 그의 진정한 모습은 하늘이 아닌 다음에 어찌 알 방법이 있겠는가? 오로지 그가 내세운 탈가면을 쓴 그의 탈춤을 보고 찍는 수밖에 없다.
당선된 후에 그는 탈가면을 벗고 탈춤을 추지 않는다.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의 진정한 얼굴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생면부지의 얼굴로 되돌아가 그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이 배가 되는 법이다.
초선 의원수가 전체의 44%, 4년마다 교체되는 의원수를 고려하면 대략 8년마다 전체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고 봐야 하겠다.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사람은 바뀌어졌지만 정치풍토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1948년 제헌국회의원이 선출된 이래 22대까지 76년간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명멸해갔지만 바뀌지 않은 것이 바로 정치풍토였다. 소신(所信)정치는 당선되기 위한 구호에만 불과했고 당선 후에는 기존의 모리(謀利)정치에만 골똘했다.
정치(政治)는 바를정(正)과 물수(氵)변이 상징해주듯이 국민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 물(경제)을 다스리는 것을 뜻한다.
이 정치란 개념의 이념과 소신 철학이 있는 정치인이 되고자 그 등용문을 두드릴 때는 이른바 정치가의 탈을 쓰지만 일단 되고 나면 정치꾼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아무렇지 않게 봐왔던 것이다.
정치인이 되어 담벼락에 서면 이쪽에는 정치꾼의 나락이 있고 저쪽에는 정치가의 극락이 존재한다. 정치꾼은 직업화하여 자기의 이기적인 사고에 함몰되어 당리, 사리에 최대의 주안점을 두어 행동하는 자를 가리키고 정치가는 국민을 위한 이념의 소신과 철학을 기본사상으로 하여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보여진다. 영어로는 정치꾼을 politician, 정치가를 statesman이라 일컫는다.
정치꾼과 정치가의 분별기준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필자는 다음의 criteria로 구분하고 싶다.
정치꾼은 다음과 같다.
1. 중상, 모략, 비난에 막말을 거칠게 자주하는 자
2. 자본축적에 조산원 역할을 한 자
정치가는 다음과 같다.
1. 이념과 철학 행동지침이 미래지향적인 자
2. 사리보다는 공리에 충실한 자
3.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자
정치 신인들이 진정한 정치가의 길을 갈고 닦기 위해 어떠한 가르침을 교훈으로 해야 할지 동, 서양의 현인들에게서 찾아본다.
서양의 그리스 플라톤은 지혜를 가지라고 주문한다. 지혜는 단순한 감각적 지식이 아니라 이성(理性)의 눈으로 실재를 보는 통찰능력을 말한다. 이 능력으로 국가를 더 나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중국의 공자는 30세에 이립(而立), 40세에 불혹(不惑) 50세에 지천명(知天命), 60세에 이순(耳順), 70세에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라 했다.
30세에 뜻을 세우고 40세에 유혹당하지 않고, 50세에 하늘의 뜻을 알고, 60세에 남의 말을 깨닫게 되고, 70세에 마음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바로 이 공자의 말씀이 훌륭한 정치가가 되는 가르침이 될 것 같다.
공자가 72세에 사망했기에 80세 이후의 삶을 얘기하지 못한 것은 100세를 바라보는 우리 후대인들에게는 아쉬울 따름이다.
***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옴부즈맨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세계 1위 조코비치, 무릎 부상으로 프랑스오픈 테니스 8강서 기권 (0) | 2024.06.07 |
|---|---|
| ‘뇌사’ 국가대표 3명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되었다.…“함께한 모든 순간이 선물, 사랑해” (0) | 2024.06.07 |
| 상명대 급경사 언덕서 마을버스 또 뒤로 밀려…37명 부상 (0) | 2024.06.07 |
| [속보]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남편, 주차장서 숨진 채 발견 (1) | 2024.06.07 |
| ˝노태우 비자금 300억 태평양증권에?“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쟁점 (1) | 2024.06.07 |